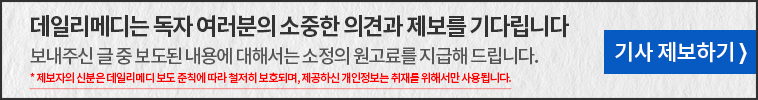뉴스 - 의료기기/IT

한국 스마트 헬스케어 '이상-괴리' 심각
한해진 기자 (hjhan@dailymedi.com)
2018.10.30 15:16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헬스케어 분야를 취재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 개발되고 있었나' 싶을 만큼 다양한 시제품을 만나게 된다.
전기 자극으로 우울증을 치료하고, 피 한 방울로 어떤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 알려주거나 몸속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면서 병변을 치료하는 캡슐 내시경 같은 제품들이 개발됐거나 혹은 개발 중에 있다.
가상현실에서 심리치료를 하거나 수술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은 흔하다.
가상현실에서 심리치료를 하거나 수술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은 흔하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얘기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과 장비에 대해 설명할 때는 밝았던 표정이 점차 어두워진다. 특히 앞으로의 전망을 물을 때 더욱 그렇다.
“지금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데 전망을 말하라니 갑자기 책임감이 무거워진다”며 고소(苦笑)를 머금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
“지금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데 전망을 말하라니 갑자기 책임감이 무거워진다”며 고소(苦笑)를 머금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
실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 최신 기술들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장비들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업체들은 드물다.
기기를 개발했더라도 다년 간 허가 및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주된 이유지만 시장에 진입할 준비가 된 장비들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아직 소비자들이 헬스케어 서비스가 꼭 돈을 지불하고 이용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국내에서 처음 건강관리 스마트 벨트를 개발한 웰트 강성지 대표는 “10대는 물론이고 20, 30, 50대까지도 주된 관심사가 ‘헬스케어’인 세대는 없다. 헬스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사를 파악해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처음 건강관리 스마트 벨트를 개발한 웰트 강성지 대표는 “10대는 물론이고 20, 30, 50대까지도 주된 관심사가 ‘헬스케어’인 세대는 없다. 헬스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사를 파악해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병원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장비를 팔아보면 어떨까?
외려 문전박대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병원은 의료기기를 사서 환자를 진료하고 수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치료행위를 하도록 만든 장비는 구입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외려 문전박대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병원은 의료기기를 사서 환자를 진료하고 수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치료행위를 하도록 만든 장비는 구입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헬스케어 쪽으로 눈을 돌린 기업 중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여기에서 당황한다. 아이디어와 제품성으로 승부하겠다는 야심을 품었다가 결국 나도 ‘기승전수가’를 얘기하게 됐다고 토로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사실 국내 헬스케어 시장은 성장이 아니라 발아하기도 어렵도록 척박하다. 전체 의료기기업체 중 80%가 연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라는데 헬스케어 기업들은 여기에 들기만 해도 감사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얘기할 때는 바이오와 함께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를 꼭꼭 끼워 넣는다.
4차 산업혁명의 주된 일꾼이라며 추켜세운다. 과연 그럴 여력이 있는 시장일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로서는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은 커녕 각자도생하기도 버거운 입장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된 일꾼이라며 추켜세운다. 과연 그럴 여력이 있는 시장일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로서는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은 커녕 각자도생하기도 버거운 입장이다.
다행히 정부가 올해 안으로 의료기기 규제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 선포를 예고했다. 혁신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도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들도 업체가 시장 수요에 맞는 장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 모든 선언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암담한 헬스케어 시장을 보기 좋게 포장하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병원들도 업체가 시장 수요에 맞는 장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 모든 선언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암담한 헬스케어 시장을 보기 좋게 포장하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한해진 기자 (
한해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