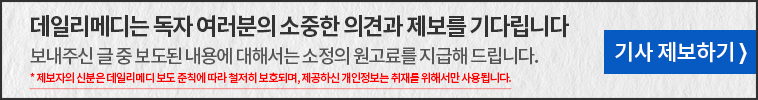[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대리처방에 대한 명확한 요건 및 처벌 강화 규정이 신설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선 현장 의료진들은 그리 달가워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무분별하게 대리처방이 이뤄지면서 처방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가결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는 12일 대리처방 가능 사유로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특히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외에 '정신질환으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높거나 치료를 거부해서 본인, 가족 등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높은 자살률과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질환이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동적 공격성 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당시 통과된 법안을 보면 대리처방에 대한 별도 근거와 대상을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로 한정했고, 대상은 환자 가족으로 제한했다.
또한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리처방이 약의 도용 및 특별히 졸피뎀이나 마약류 등을 빼돌리는 위험요인이 있어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리처방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삭제했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의사 등이 대리처방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조속한 보완을 촉구하며 대리처방 사유에 정신질환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강력 범죄 중 정신질환이 관련된 경우 대리처방이라는 부득이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적절한 약물치료를 가능케 한다면 범죄에 따른 희생과 피해를 크게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문제 발생 및 악화에, 직계 보호자가 직간접으로 연관된 경우 환자가 이 같은 법안에 한정된 보호자만으로 대리처방의 대상을 한정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부 정신질환 치료에 오히려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간헐적 공격성을 불규칙하게 보이는 특정 정신질환은 투약을 완강히 거부해 결국 보호자는 병원을 가자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만 가중되는 고통을 겪는다.
의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중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 비율이 2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노령화 상황을 감안하면 대리처방의 주체를 보호자 범주로 한정하고 처벌 조항을 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주체로서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함께 방문해 전문의 확인을 득한 경우는 보호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드시 포함해 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의료법을 비롯해 어떠한 법안이 개정 및 신설되더라도 국민 정신건강에 위해(危害)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메디 기자 (
데일리메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