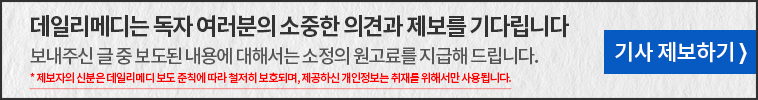뉴스 - 의원/병원

올해도 다사다난(多事多難) 예고 중소병원
주 52시간 근무·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 구체화될 듯
한해진 기자 (hjhan@dailymedi.com)
2019.01.31 11:42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연초에는 흔히 앞으로 펼쳐질 한 해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지만 최근 중소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숨이 늘고 있다. 지난해 병원계를 강타했던 정책들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진 안전 문제 논란이 또 다른 의무화 규정으로 작용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지난해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주 52시간 근무제 및 최저임금 인상이다. 올해는 그 여파를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는 게 병원계 종사자들 증언이다.
서울 소재 내과의원 A원장은 “가뜩이나 구인이 어려운데 최근에는 임금 조건까지 맞춰줘야 해서 더 힘들어졌다”며 “사람을 쓸 수도,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병원은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연장 근무를 하는 것도 부담될 뿐더러 52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무조건과 임금이 아니면 지원자조차 없다는 게 A원장 설명이다.
또 다른 지방 소재 B병원 원장도 “기본적인 임금 기준과 근무 조건은 당연히 지켜줘야 하는 것이지만 소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소병원도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무 시행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조건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 있는 사람을 붙잡아 두기도 어려운데 작은 병원에 누가 오려 하겠느냐”며 “이렇다 할 보완책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병원계가 한바탕 진통을 겪었던 병상 간 이격거리 확대 정책도 결국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반적인 병상 감소에 따라 진료 수익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C정형외과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병원마다 준비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병상이 빠져나간 데 따른 민원이나 수익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D종합병원 원장은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병상 가동률이 적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데 의무 규정이 계속해서 늘어나 인증 준비가 점차 부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보안시설 확충·인력 충원 등 여력 미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진 안전 문제도 뒷전이다.
최근 응급실에서 환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의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대형병원은 보안 강화에 나서는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실 내 대피통로나 비상벨 설치 및 보안요원 배치 등의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얼마 전 의료계와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 ▲비상벨 등 호출시스템 마련 ▲전용 대피로·대피공간 등 방지시설 운영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안전 문제는 의료기관 규모를 막론하고 반드시 점검돼야 할 사항이지만 여건상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실 내 대피통로나 비상벨 설치 및 보안요원 배치 등의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얼마 전 의료계와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 ▲비상벨 등 호출시스템 마련 ▲전용 대피로·대피공간 등 방지시설 운영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안전 문제는 의료기관 규모를 막론하고 반드시 점검돼야 할 사항이지만 여건상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앞서 B병원 원장은 “안전 강화는 둘째 치고 병원에 남자가 나 하나다. 작은 병원이니 별 일 없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라며 “현실적으로 대책 마련은 안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자조 섞인 답을 했다.
지역 소재 E병원 원장은 "중소병원은 소위 진상 손님 수준의 클레임이 많다 보니 안전 논의에서는 소외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역 소재 E병원 원장은 "중소병원은 소위 진상 손님 수준의 클레임이 많다 보니 안전 논의에서는 소외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의료진 안전 문제 논란이 또 다른 의무화 규정으로 작용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E병원 원장은 "보안 인력은 둘째치고 비상벨이나 대피로 마련 등을 위해서는 병원 시설에도 손을 대야 한다"며 "안전 장비가 스프링쿨러처럼 또 다른 인증 기준이나 의무 사항이 돼서 운영이 어려워지는 일이라도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한해진 기자 (
한해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