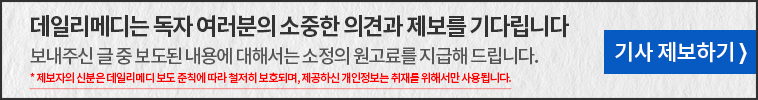오피니언 - 수첩

의전원 입학서 비화된 한국사회 정의(正義)
고재우기자
고재우 기자 (ko@dailymedi.com)
2019.09.24 18:02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첩] 누구에게나 정의는 있다. 파편화된 사회에서 정의(正義)를 정의(定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만큼 우리는 묵시적으로 이에 대한 합의를 한다. 그 결과물이 좁게는 성문화된 규정 및 법(法)이고, 관념적이며 넓게는 상식(常識)이라 할 수 있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첩] 누구에게나 정의는 있다. 파편화된 사회에서 정의(正義)를 정의(定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만큼 우리는 묵시적으로 이에 대한 합의를 한다. 그 결과물이 좁게는 성문화된 규정 및 법(法)이고, 관념적이며 넓게는 상식(常識)이라 할 수 있다.그래서 최근 ‘한 달’은 의료계에도, 우리 사회에도 안타까운 나날이었다. 국가 법무행정 수장 검증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딸의 의혹들로 넘쳐났다. 갖가지 의혹의 중심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있었다.
조국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의대 논문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수시입학에 이용됐다는 논란을 샀고, 대한병리학회는 긴급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해당 논문을 취소했다. 또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에는 동양대 표창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기록 등이 이용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논란의 근저에 ‘의과대학 만능주의’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판·검사와 마찬가지로 의사는 우리사회의 엘리트계층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들은 위법의 경계선에서 혹은 일반상식과 동떨어진 수단을 통해 계층을 ‘대물림’한다.
김두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저서 ‘불멸의 신성가족’을 통해 이를 짚어냈다.
'신성가족'이란 불경스러운 대중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투쟁 끝에 마침내 고독하고, 신을 닮았으며, 자기만족적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된 사람을 뜻한다. 판·검사 집단을 저격한 단어이지만, 의료계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신성가족'이란 불경스러운 대중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투쟁 끝에 마침내 고독하고, 신을 닮았으며, 자기만족적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된 사람을 뜻한다. 판·검사 집단을 저격한 단어이지만, 의료계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6월 데일리메디가 단독보도 한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교수 연구부정 의혹(2019년 6월 12일자)’은 국내 유수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국가예산이 투입된 논문에 자녀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사실을 고발했다.
이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한 행위다.
이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한 행위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교수들 자녀가 모두 ‘뉴턴’이 아닌데, 모든 자녀들이 뉴턴이라고 올라온 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에는 前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이 작성한 논문을 딸의 실적으로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입학취소가 결정됐다.
일련의 상황들에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엘리트계층의 일탈행위로 드러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일련의 상황들에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엘리트계층의 일탈행위로 드러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씨 논문에 대해 “미국에서 의사를 하는 분은 제2저자가 됐다”며 “제1저자에 오르지 못 한 것도 억울한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만든 논문은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조씨와 마찬가지로 성균관대 교수 딸은 누군가를 제치고 의전원과 치전원 자리를 차지했다.
나아가 조씨와 마찬가지로 성균관대 교수 딸은 누군가를 제치고 의전원과 치전원 자리를 차지했다.
결국 의대 만능주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훼손시켰다. 이미 하나의 계급으로 변해버린 의사라는 직업 앞에서 ‘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는 선언은 무색해졌다.
이를 대물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정에서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는 다짐도 힘을 잃었다.
의대 만능주의에 경도돼 상식을 잃어버린 사회에 서울대·고려대·부산대 학생들과 4000여 명이 넘는 교수들이 묻고 외쳤다.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고재우 기자 (
고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