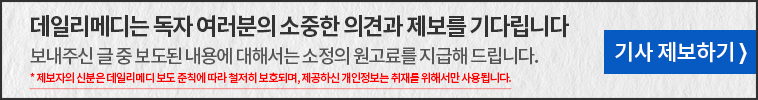[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2018년 9월 의료광고사전심의가 시작된 이후 불법광고 차단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공동광고, 기사광고 등 애매한 영역도 존재했다.
또 앱, 소셜 커머스를 이용한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에는 접근이 불가능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25일 의협은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25일 의협은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사진]은 “다시 도입된 의료광고 사전심의 초기에는 적치된 건수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는 순조롭게 심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인력구성을 늘리고 실시간으로 업무를 진행했다. 서면 중심 심의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심의로 개편되는 과정이 있었다”며 지난 1년을 회고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사전심의로 승인한 광고건수는 약 1만4000건이었다. 이 중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순으로 광고가 많았고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 광고가 약 1만건으로 조사됐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지적하듯 인터넷 광고가 모든 매체가 당연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 1만2000건 수준이 포털을 이용한 인터넷 광고였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 속 현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쟁점은 공동광고, 기사광고 등을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다.
그는 “공동광고와 관련해 같은 종별 및 전문과목 간 광고는 인정된다. 하지만 종별이 차이가 있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광고에 대한 해석은 쉽게 내리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현재 광고 주체 2곳 이상의 공동광고 시 건물사진, 의료인 사진 게재는 불허하는 기준을 통해 소비자 현혹을 차단하는 기준을 발동 중이다.
원칙적으로 기사형태의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 의료법 상 ‘기사성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분석할 기준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 위원장은 “정보제공 형태를 가장해 의료기관 명칭 내지 의료인 경력을 노출시켜 환자 유인을 하는 광고가 많다. 이는 타 의료광고와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의 불가능한 매체, 실무적 한계
의료광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터넷 매체 외에도 현수막, 전광판, 정기간행물, 전단, 벽보, 교통시설, 신문 등은 심의대상이 된다.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는 대상이 아니다.
이날 최정희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일일이 잡아내기도 어려운 데다가 의료법 시행령 상 관련 고시가 마련되지 않았다. 사전심의 시행 이후 앱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는 만연했지만 이 영역에서의 공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말 앱 및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불법 의료기관 278곳 적발 등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거론됐다.
노복균 대한성형외과학회 홍보이사는 “앱을 통한 광고에서는 낮은 가격, 높은 할인율이 강조돼 의료기관 간 과열경쟁을 일으킨다. 이를 묵인할 경우 진료 패러다임이 붕괴돼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때문에 앱 의료광고에 있어서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앱 의료광고는 일평균 방문객 10만 이하인 경우로 제한돼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유인 알선 행위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재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앱 광고 등 논란이 되고 있는 10만명 기준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다운로드 등 다른 대체 기준도 찾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반영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 담당업무를 맡게 된 지 갓 한달이 넘었다. 그래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 많은 의견을 듣고 참고하겠다. 정부는 위법여부만 관여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범위와 기준을 다룰 수 있다. 이제 시행 1년 의미를 찾고 새로운 대안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박근빈 기자 (
박근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