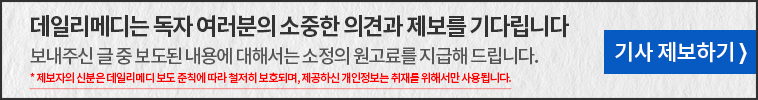뉴스 - 학술/학회

난공불락 노벨의학상, 올해도 '무관(無冠) 설움' 대한민국
2019년 美·英 과학자 3명 공동수상···118년 동안 수상자 전무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2019.10.08 06:02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개인의 영예를 넘어 국격(國格)이 거론될 정도의 절대적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노벨위원회는 2019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미국 하버드대 데이나파버 암연구소 윌리엄 케일린 교수(62), 영국 프랜시스크릭연구소 피터 랫클리프 교수(65), 미국 존스홉킨스대 그레그 서멘자 교수(63)를 선정했다.

이들은 유기체에서 산소의 기능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 받아 노벨생리의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기체 내에서 산소의 양에 따른 세포 변화는 지난 수 백년 동안 규명된 바 없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은 유기체 내 세포가 산소 공급에 따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분자 수준에서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인간과 동물세포가 생존에 필수적인 가용 산소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적응하는 경로를 발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빈혈과 암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연구진이 확립한 것은 ‘산소 가용성(Oxygen Availability)’이라는 개념이다. 인간이나 동물은 호흡을 통해 얻은 산소를 섭취한 음식과 함께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활용한다.
산소 수치는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고도가 높은 곳에 있을 때,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등 여러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세포는 신진 대사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인체의 산소 감지 능력은 새로운 적혈구 또는 새로운 혈관 생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인체의 산소 가용성을 이해하면 암이나 빈혈 등 난치성 질환의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
수상자들은 HIF-1(hypoxia-inducible factor 1)이라는 유전자가 저산소 환경에서 인체를 돕는 기전을 규명하고 산소 및 호흡과 깊은 연관이 있는 빈혈 및 암 치료법을 연구했다.
HIF-1 유전자는 전사인자 단백질이다. DNA에 붙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RNA를 만들어낸다. HIF-1은 저산소 환경에서 발현이 증가한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산소가 정상적으로 체내에 있을 때 HIF-1은 분해돼 없어지지만 저산소 환경에 놓이면 분해를 시키지 못하고 농도가 갑자기 증가한다.
세포가 저산소 환경에 놓이면 세포가 죽는데 HIF 농도가 증가하면서 세포 내 산소 수준을 안정화시킨다.
혈액 내 산소 호흡과 직접 관련 있는 빈혈을 포함해 HIF는 암 치료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종양이 커지면 안쪽 종양세포들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때 HIF-1 유전자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종양 안쪽 깊은 곳에서 발현되는 HIF-1 유전자를 조절하면 종양세포의 중심부가 저산소 환경에 놓이게 되며 암세포 전이를 막을 수 있다.
한편, 노벨생리의학상은 인간에 대한 생리학이나 의학뿐 아니라 동물, 식물 등 모든 생명체와 관련된 생물학 분야 전반의 연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의학상 설립 초기에는 고전 생리학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70년대부터는 동물, 식물 등의 연구도 수상했다.
1973년에는 꿀벌의 춤 연구, 거위와 오리의 각인 현상에 대해 연구한 교수와 동물행동학 분야를 조명한 조류학자 등이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1983년에는 옥수수 유전학으로 대표되는 식물유전학 분야 연구자 바버라 매클린톡이 수상한 바 있다.

노벨의학상 절대강자 ‘미국’-신흥강자 ‘일본’
노벨생리의학상은 1901년 이후 지금까지 총 110차례에 걸쳐 21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여성 수상자는 12명이다.
수상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미국이 104명으로 독보적인 강세를 유지해 왔다. 이어 영국이 30명, 독일 16명, 프랑스 11명, 스웨덴 8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스위스·호주(6명), 덴마크(5명), 오스트리아(4명), 네덜란드·이탈리아·벨기에(각 3명) 등도 간간히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소식을 알렸다.
물론 노벨상 수상자 중 귀화·이민·이중국적 등으로 국적 통계는 간단하지 않지만 생리의학상 분야에서 만큼은 절대적 강국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섭렵해 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제 역대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 22개국 중 유럽이 16개국으로 압도적이다. 비율로도 72.72%를 차지한다.
독일, 영국, 덴마크,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헝가리, 포르투칼,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웬만한 유럽 국가들 모두 수상자를 배출했다.
노벨상 제정 초기 생리의학상은 늘 이들 유럽 국가의 몫이었다. 하지만 1930년 미국의 카를 란트슈타이너가 ‘인체 혈액 분류’를 통해 첫 수상한 이후 생리의학상 판도가 달라졌다.
미국의 기초의학 연구 성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의학자들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이 잇따랐고, 단기간에 이 분야의 절대강국으로 등극했다.
캐나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남미나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간헐적으로 수상자가 배출되기는 했지만 미국의 강세는 8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최근 노벨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일본의 약진이다. 1949년 유카와 히데키가 물리학상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2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실제 역대 수상자 25명의 구성을 보면 물리학상 10명, 화학상 7명, 생리의학상 5명, 문학상, 2명, 평화상 1명으로, 과학 분야의 수상 비율이 단연 높다.
특히 21세기, 그러니까 최근 19년 동안 노벨상을 받은 일본 의과학자는 19명에 달한다. 이 기간만 따지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성적이다.
생리의학상 부분에서는 1987년 도네가와 스스무 교수가 ‘면역 항체의 다양성 해명’으로 첫 수상을 한데 이어 2012년에는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를 진행한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5년에는 미생물을 통해 기생충 번식을 억제하는 약제 원료들을 발견한 기타사토대학교 오무라 사토시 교수가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며 역대 3번째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2016년에는 도쿄공업대학 오스미 요시노리 명예교수, 2018년에는 교토대학교 혼조 다스쿠 명예교수가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될성부른 일본···되고싶은 한국
일본의 도드라진 약진은 아시아 국가로는 빨리 근대화를 시도하며 서양과학을 수용했고,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해 연구의 저변을 확대한 결과다.
즉 19세기 말 시작된 현대 기초과학의 출발에 직접 동참할 수 있었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 일본을 노벨상 신흥강국으로 만들어준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실제 일본 내 100년의 역사를 보유한 기초과학 연구소가 즐비하다. 여기에 지속적인 투자와 인재 육성 정책 등이 어우러지면서 잇단 노벨상 수상자 배출이라는 쾌거를 올리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일본 노벨상 수상자들의 행적이다. 과거 일본 노벨상 수상자는 도쿄대와 같은 유명 대학 출신으로,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일본 현지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다음 일본을 대표하는 기초과학 연구소에서 연구 경력을 쌓았다. 이게 일본 노벨상 수상자의 표준 모델이었다.
하지만 일본 노벨상 수상자 모습은 10여년 전부터 크게 변했다. 지방대학을 졸업해도 대학원은 도쿄대에서 밟는게 보통이었으나 요즘은 달라졌다.
지방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를 내리 밟는 수상자가 늘었다. 지방대학을 나와 지방 중소기업에서 연구 경력을 쌓다가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
2000년 이후 쏟아진 수상자는 일본에서 노벨상으로 가는 경로가 달라졌음을 확연히 보여준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사이의 연구 수준과 여건 차이가 눈에 띄게 좁혀졌다. 연구 마당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노벨상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은 한국 연구자 대부분이 해외대학 박사 출신인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연구 환경 차이가 확연한 것 역시 일본과 차이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세계 1위다. 총액 기준에서는 아직 일본의 1/3이지만 경제 규모와 인구 차이를 감안하면 적잖은 수치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을 위한 연구 목표 설정과 연구비 배분은 여전히 미숙한 상황이다.
한 원로 의학자는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떨어지는 자판기처럼 노벨상은 연구비를 쏟아붓는다고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며 “목표와 배분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노벨상이 20~30년 전 연구실적으로 수상 여부가 결정된다”며 “역으로 말하면 20~30년 후에도 참신하고 중요하게 여겨질 연구 테마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10년 간 연구성과를 토대로 노벨생리의학상에 근접한 과학자 5명을 선정, 발표했지만 이번 수상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이 기대됐던 과학자는 RNA 연구자 서울대 김빛내리 교수, 위암 표적항암제를 연구하는 서울의대 방영주 교수, 합성생물학 등 시스템 대사 공학 권위자 KAIST 이상엽 교수, 진핵세포를 연구하는 연세대 이서구 교수와 유전체 반복 변이를 발견한 이찰스 이화여대 이찰스 교수 등 5명이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대진 기자 (
박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