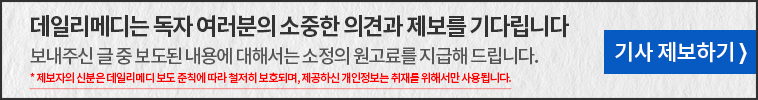[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최근 메릴랜드대학교 의료진이 최초로 환자를 가사(假死) 상태로 만든 후 수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저체온 요법을 통해 뇌와 장기를 보호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의료계는 실험적인 방식임에 동의하는 가운데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저체온 치료는 환자에게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거나 패드를 부착해 평상시 37도 정도인 체온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대사량과 산소 소비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뇌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원리다.
지금까지 저체온 치료는 주로 심정지나 뇌경색 등의 환자들 뇌 손상을 막기 위해 사용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메릴랜드 대학교 메디컬센터 의료진은 총에 맞거나 칼에 찔리는 등의 외상성 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저체온 치료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이른바 ‘가사 상태’로 유도했다.
공식적으로는 EPR(Emergency Preservation and Resuscitation)로 불리는 이 치료법은 미FDA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2020년 말은 돼야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EPR은 그 대상 뿐 아니라 체온을 낮추는 정도에서도 기존 저체온 치료와 차이가 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저체온 치료의 경우 합병증 우려 등으로 체온을 32~34℃로 낮춘다.
하지만 EPR은 환자 혈관에 냉각된 생리식염수를 투입해 체온을 10~15℃까지 낮춤으로써 뇌(腦) 활동을 거의 멈추게 한다. 그 상태로 2시간 가량 수술이 이뤄지고 수술 후 다시 체온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처럼 EPR은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벌어준다.
한편, 국내에서는 현재 심정지와 뇌신경질환 환자에 대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저체온치료가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018년 강릉펜션 사고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학생들이 저체온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금년 7월 급여가 적용되면서 비용이 기존 200만원 대에서 20~30만원 수준으로 낮아져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술 중 발생 문제 방지 가능 vs 최후 실험적 방식 우려 제기
박규남 한국저체온치료학회 회장(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EPR 대해 "저체온 요법과 유사한 방식이라며 활용도를 넓혀 환자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남 회장은 1997년 국내에 최초로 저체온 치료를 도입해 심정지 환자들을 중심으로 적용 중이다.
박 회장은 “출혈이 많은 외상에 저체온 치료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실험적”이라며 “외상쪽에서도 저체온 치료 요법이 활용될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임상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면 심정지나 뇌경색 환자들뿐만 아니라 수술 전(前)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수술 중 중요 혈관을 잘못 건드려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EPR을 적용하게 되면 수술 중 그런 문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뇌신경질환에 대한 저체온 치료를 국내에 도입한 한문구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다른 치료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최후에 시도되는 실험적 방식”이라며 “미FDA는 허가를 내렸지만 한국에서는 윤리적 문제 등으로 아마 시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아직은 동물실험 결과만 발표가 난 상태이지만 임상시험 결과 몇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획기적인 실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
박민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