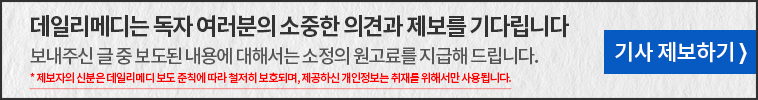[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공익을 위해 개인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다룬 ‘바이오데이터 공유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수용성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연구원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로 운동량, 체중, 혈압, 심박수 등 개인건강 정보를 측정해본 경험이 있는 국민 비율은 2016년 17%, 2017년 32.2%에서 2019년 70%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응답자의 2/3는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후 앱 등을 통해 진료기록부와 같은 개인의료정보에 접속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 기기에서 측정된 개인건강 정보가 건강관리앱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서버에 보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인식하고 있었다.
병원 진료기록 등 개인의료 정보가 병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에 보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74.2%에 달했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로 수집된 개인건강 정보와 병원진료기록 등의 의료정보를 연계해 신약 개발과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30% 수준에 그쳤다.
산업연구원은 “이는 국민이 데이터·AI 기반 바이오 경제에서 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아직까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소유권과 관련해서는 80% 이상이 ‘각 개인의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관련 정보에 대한 권한 역시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6.8%에 달했다.
이는 진료기록부 열람권에 한정되는 권리가 합리적(48.0%)이라는 응답과 상반되는 결과로, 보고서는 국민의 바이오데이터 소유권과 관리권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개인 보건의료 정보보호와 공유 관련 인식에서는 ‘난치병 치료제’ 개발 등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보건의료정보 공유·활용을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78%로,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개인 보건의료정보의 공유·활용을 허락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는 ‘국가적 처벌 시스템의 공정성’, ‘연구개발 성과와 이익을 사회공공의 이익으로 공유’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들은 ‘개인 보건의료 정보를 악용하거나 이익을 편취했을 경우 징벌시스템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박민식 기자 (
박민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