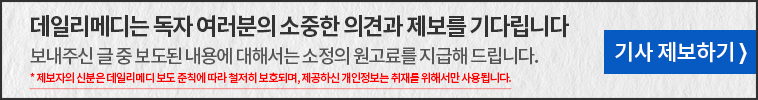오피니언 - 수첩

메르스와 신종 코로나, 씁쓸한 '공통분모'
한해진기자
한해진 기자 (hjhan@dailymedi.com)
2020.02.09 17:04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수첩] “몇 층으로 가세요?” 며칠 전 취재를 위해 某 대학병원을 찾았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기자를 보고 마스크를 한 직원이 불분명한 발음으로 물었다.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수첩] “몇 층으로 가세요?” 며칠 전 취재를 위해 某 대학병원을 찾았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기자를 보고 마스크를 한 직원이 불분명한 발음으로 물었다.
그 모습이 갑자기 예전의 기억을 떠오르게 했다. 메르스 사태가 수그러들 무렵 취재를 위해 찾았던 병원에서 ‘어디로 가느냐’며 방문객 전용 엘리베이터를 안내해 주던 직원과 같은 모습이었다.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 병원 간병문화나 병문안 문화, 정부 감염관리 정책을 전반적으로 바꿔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역시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했다.
사회적 인식은 많이 바뀌었을까. 기자가 방문한 대학병원은 체온계를 들고 출입문을 지키거나 복도를 오가며 마스크를 나눠주고 인적 사항을 묻는 직원들과 방문객으로 붐볐다.
평소보다 환자가 늘었냐고 묻자 직원은 “정신이 없긴 한데 외래환자들이 이것, 저것 안 물어보고 진료만 받고 빨리 간다. 평소보다 민원이 줄었다”라며 “예전과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다”고 답했다.
평소보다 환자가 늘었냐고 묻자 직원은 “정신이 없긴 한데 외래환자들이 이것, 저것 안 물어보고 진료만 받고 빨리 간다. 평소보다 민원이 줄었다”라며 “예전과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다”고 답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감염병 대응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병원은 최근 긴장의 연속이다. 심포지엄이나 건강강좌 등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크고 작은 행사는 모두 취소됐다. 소규모 연수강좌는 물론 학회들도 학술대회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기존 업무와 감염 대응 업무를 병행해야 한다. 확진자를 치료하는 곳은 물론 다른 의료기관도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나눠 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의료기관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은 ‘원내감염’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혹여나 의료진 감염이 발생할 경우, 너도나도 기다렸다는 듯 나서 환자를 치료해야 할 병원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비난을 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24명의 확진자 발생에도 아직까지 의료진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확진자가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수퍼 전파지'가 될 거라는 섣부른 의혹을 받았던 광주 21세기병원도 현재까지 의료진과 환자 가운데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확진자가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수퍼 전파지'가 될 거라는 섣부른 의혹을 받았던 광주 21세기병원도 현재까지 의료진과 환자 가운데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석에 대한 논문도 발표됐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팀은 국내 첫 확진자의 증상 및 치료 경과를 담은 논문을 공개하며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의학적 근거를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팀은 국내 첫 확진자의 증상 및 치료 경과를 담은 논문을 공개하며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의학적 근거를 설명했다.
이런 의료인들의 노력만큼 감염 인프라 발전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원 별도 건립을 포함하고 있는 원지동 이전 사안은 16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도 이미 2018년에 국립검역소 인력이 부족하다는 호소를 한 바 있다. 질본에 따르면 최근 입국자 검역인원 기준 해외여행객은 5000만 건에 달한다. 국립검역소 직원은 453명에 불과하다.
상시 검역 외에 이번처럼 오염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 등을 위해 필요한 적정인원은 533명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교대제 근무 특성과 생물테러 등 특별업무를 전담인력을 포함하면 총 739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질본의 인력증원 요청은 국회에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상시 검역 외에 이번처럼 오염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 등을 위해 필요한 적정인원은 533명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교대제 근무 특성과 생물테러 등 특별업무를 전담인력을 포함하면 총 739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질본의 인력증원 요청은 국회에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정부는 메르스 이후 신종감염병 관련 재정지출이 2017년 1276억원에서 2020년 1943억원으로 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병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셈이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메르스와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일치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사투에 가까운 노력’이다. 출입구 관리부터 진단과 치료법 개발까지 의료인들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다.
이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도 변함없다. 여전히 ‘발전적인 사후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이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도 변함없다. 여전히 ‘발전적인 사후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한해진 기자 (
한해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