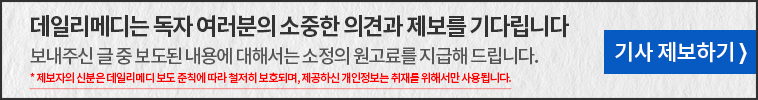[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환자가 저산소증을 보일 때 의료진의 처치방법 중 하나인 스스로 엎드린 자세 취하기(self-proning)가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미국 의학저널 (NEJM)에 기고됐다.
앞서 심각한 저산소증을 보이는 코로나19 환자들에겐 초기 삽관이 권고됐지만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일부 병원들은 침습적 시술인 삽관을 되도록 피하기 위해 급성호흡곤란(ARDS)을 보이는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엎드린 자세를 취하도록 처치하고 있다.
'엎드린 자세 취하기'는 코로나19 유행기 동안 인공호흡기의 대안으로 급성호흡곤란 환자들에게 처치되고 있지만, 이 역시 약한 권고사항에 해당하고 있다.
미국 의학저널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의 응급의학 편집위원인 로렌 웨스타퍼 메사추세츠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교수는 뉴욕시 응급부서 연구진들과 함께 저산소증을 보이는 코로나19 의심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이송 직후 산소포화도와 스스로 몸을 뒤집은 상태로 한 뒤 산소포화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이송 직후 산소를 보충했을 때 84%였던 산소포화도는 환자가 5분 동안 스스로 몸을 뒤집어 뉘인 후 94%까지 증가했다.
최종적으로 관찰 환자의 36%는 72시간 내 삽관을 했고, 이 중 38%는 이송 한 시간 내에 삽관했다.
웨스타퍼 교수는 "이번 소규모 연구에선 엎드린 자세를 통해 환자 3분의 2가 삽관을 피해 피침습적 형태로 산소 포화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환자 산소포화도가 5분 정도 개선됐지만 효과의 지속시간은 불명확했다"고 덧붙였다.
 박정연 기자 (
박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