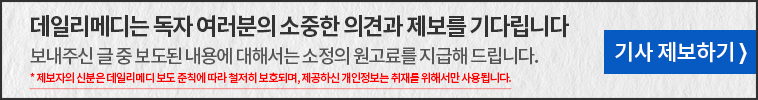오피니언 - 수첩

공공의대 포함 지방 의과대학 설립과 의사 부족론
고재우기자
고재우 기자 (ko@dailymedi.com)
2020.07.03 19:47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수첩] 전국에서 의과대학 신설 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역 의대 신설은 당연한 ‘명제’가 돼버린 모양새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수첩] 전국에서 의과대학 신설 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역 의대 신설은 당연한 ‘명제’가 돼버린 모양새다.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6월4일 교육부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게 부여하던 의사면허 자격을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도 6월19일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내놨다.
기동민 의원은 같은 달 22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공공보건의료법을 발의했다.
청와대발로 의대정원 증원 이야기가 나온 이후 의대 신설을 위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기동민 의원은 같은 달 22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공공보건의료법을 발의했다.
청와대발로 의대정원 증원 이야기가 나온 이후 의대 신설을 위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비단 국회만이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나타냈고,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도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공언했다.
정계나 지자체에서 의대 유치 의지를 표명한 지역은 무려 6곳에 달한다. 그야말로 의과대학 유치 각축전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대를 유치할 경우 부속병원 설립 등에 3000억원 정도가 든다. 모두 ‘지역발전론’ 때문에 뛰어든 것"이라고 일침했다.
정계나 지자체에서 의대 유치 의지를 표명한 지역은 무려 6곳에 달한다. 그야말로 의과대학 유치 각축전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대를 유치할 경우 부속병원 설립 등에 3000억원 정도가 든다. 모두 ‘지역발전론’ 때문에 뛰어든 것"이라고 일침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과연 지역 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별 의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방의대를 나온 의사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극약 처방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졸업자에게 10년 간 의무복무 규정을 뒀다.
개인 ‘자유의지’를 정책적으로 유인하는 대신 강제하는 꽤 ‘편리한 방법’을 쓴 셈이다.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의사들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이유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나쁜 법’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사들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이유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나쁜 법’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요컨대 최근 일련의 지역 의대 신설 목소리는 이런 치열한 고민을 도외시 한 채 신성불가침한 명제만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 의지란 그리 간단치 않다. 인류 발전은 개인 욕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주법을 실시했다고 해서 술이 사라지지 않았듯이 지역에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서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그 지역에 머무른다고 장담할 수 없다. 좀 더 현실적으로 전망하면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금주법을 실시했다고 해서 술이 사라지지 않았듯이 지역에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서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그 지역에 머무른다고 장담할 수 없다. 좀 더 현실적으로 전망하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무언가를 강제하는 정책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짧다. 그래서 강제하기보다는 유인해야 하고, 유인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 의지와 정책 목표를 동일 선상에 놓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책 입안자들과 관료들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국가 경영’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고재우 기자 (
고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