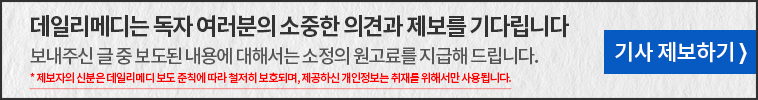[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최근 강원도 원주의 한 대형병원이 2주 이내 외식을 한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너무 지나치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민원과 항의가 잇따르자 해당 지자체가 병원에 불편을 개선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리는 등 홍역을 치렀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접한 병원들은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는 반응이다. 확진자 발생을 노심초사해야 하는 병원으로서는 더한 과잉 대응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최근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강원대병원 등에서 잇따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병원들은 코로나19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입원 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의무화 돼 있다. 혹시나 모를 병원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모든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돼야 입원할 수 있다.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병원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분만을 위해 입원하는 산모는 물론 검사를 위해 당일 입원이 필요한 환자, 특히 항암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암환자의 경우 매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암환자들은 코로나19 검사비용이 항암치료 비용을 추월하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리지만 병원들은 원내감염 방지를 위해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환자는 물론 보호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한 병원들도 있다. 외부 출입이 잦은 보호자가 감염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보호자 1인 외 면회금지, 보호자 외출 제한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향후 보호자 검사 의무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초기에만 하더라도 병원들은 확진자 방문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입게되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했지만 이제는 원내 집단감염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미 확진자 방문이나 입원환자 중 감염자가 발생한 병원이 부지기수이다 보니 주홍글씨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효율적 추가 감염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이다.
병원들의 코로나19 대응은 출입 시스템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단순 발열체크와 문진 수준에 그쳤던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대부분의 병원이 QR코드 발급을 의무화 했다.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의약품, 치료재료,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 등 병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QR코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얼마 전에는 스스로 병원 건물 내부를 이동하며 얼굴인식과 온도측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체온을 확인하는 로봇도 등장했다.
로봇이 이동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 음성과 함께 중앙 관제실로 실시간 알람을 제공한다.
 박대진 기자 (
박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