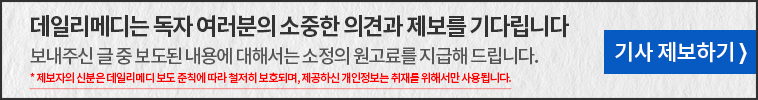뉴스 - 의원/병원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문턱 높이기' 실효성 있을까
'환자부담 적고 의료진 전원 권한 없어 회의적' 제기···상병코드 세분화 필요성도
박민식 기자 (mspark@dailymedi.com)
2020.10.26 05:07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부가 경증질환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대책을 둘러싸고 실효성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당뇨‧고혈압 등 100개 경증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기존 60%에서 100%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온다.
우선 환자들로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미미한 수준이다.
진료비 총액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60%에서 100%로 늘었지만 기존에는 총액에 포함돼 있던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 가산금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증질환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동네의원을 찾을 유인 방법이 적다는 것이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과장인 김대중 교수는 “일단 총액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당뇨병의 경우 진찰료와 검사비를 포함한 비용이 기존에 비해 3000원가량 늘어나는 수준에 그친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다른 경증질환들의 경우에도 환자 부담은 소폭 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이번 정책은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의료질평가지원금과 가산금을 받을 수 없게 해 상급종합병원을 압박하는 성격이 짙다.
의료기관들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환자를 줄여야 하지만 환자들이 동네의원으로의 전원을 거부하면 의사들로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충북대병원 진료협력센터장인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는 “동네의원으로의 전원을 제안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환자는 10명 중 5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왜 쫓아내려 하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환자와 의료기관에 부담을 떠넘기는 쉬운 방법을 택한 셈인데, 궁극적으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진료비 등을 통해 경증질환자들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을 대폭 높이고, 개원의와 상급종합병원 의사들이 경증질환자를 막고 내보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증질환 분류체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중증도에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100개 경증질환으로 분류된 상병이란 이유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다른 상병코드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 실효성 문제도 있다.
김대중 교수 역시 “경증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의사들은 상병코드를 경증이 아닌 상병을 주상병으로 바꾸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정책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조양선 교수(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는 "단순히 코드로 구분할 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진료의사의 소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가령 수술 여부가 경증과 중증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코드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에 해당 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는 경증에서 제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병원 전체의 경증환자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과별 특성을 고려해 각 과마다 비율을 다르게 하는 식의 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조양선 교수(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는 "단순히 코드로 구분할 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진료의사의 소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가령 수술 여부가 경증과 중증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코드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에 해당 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는 경증에서 제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병원 전체의 경증환자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과별 특성을 고려해 각 과마다 비율을 다르게 하는 식의 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민식 기자 (
박민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