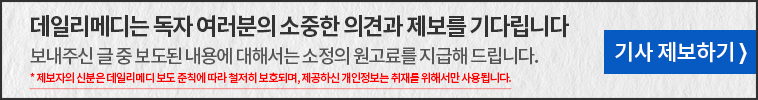뉴스 - 의원/병원

'JCI 인증' 시들···강남세브란스·이대목동·인하대병원 이탈
상급종병 가운데 4개 병원만 '인증' 유지···국내 인증원 평가 등 작용
고재우 기자 (ko@dailymedi.com)
2021.06.16 05:02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최초로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을 받으면서 일으켰던 JCI 인증 ‘붐’이 시들하다.
JCI 인증은 국제 표준의료서비스 심사를 거친 의료기관에 발급되는 것으로,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면서 퇴원까지 치료 전(全) 과정을 11개 분야 1033개 항목에 걸쳐 평가한다. 재인증 주기는 3년이다.
이미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인하대병원 등이 JCI 인증 행렬에서 이탈했고,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 JCI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곳도 세브란스병원 등 ‘네 곳’에 불과하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원인으로 국내 의료 환경에 맞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체계 및 의료진 부담 가중 등을 들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원인으로 국내 의료 환경에 맞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체계 및 의료진 부담 가중 등을 들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인하대병원 등의 대학병원들이 JCI 인증을 연장하지 않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세브란스병원에 이허 국내에서 두 번째인 지난 2010년 JCI 인증을 받았고, 2013년 재인증, 2016년 3차 인증을 받았으나 4차 인증 시도는 없었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에도 지난 2011년에 이어 2014년에도 재인증을 받았으나 이후에는 JCI 인증을 유지하지 않았고, 인하대병원도 2010년·2013년·2016년까지 3차까지 인증을 받았으나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이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JCI 인증을 받은데 이어 2010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JCI 재인증을 받고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에서는 JCI 인증을 받는 것이 당연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으로 상급종병 중 JCI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 네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체계가 국내 실정과 맞고, 코로나19 등으로 의료진의 번아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JCI 인증까지 진행될 경우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CI 인증을 받지 않기로 한 상급종병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이 진행하는 국내 기준에 집중하는 것으로 병원 내부에서 결정을 했다”고 답했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도 “2019년에는 인증원의 평가가 진행되던 중이라 인증원과 JCI 인증 두 개 다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었고, 인증 담당자 뿐만 아니라 병원 내 전반적인 업무가 늘어난다는 고려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인증원 관계자는 “국제 질 향상 학회가 기준 개발 시 요구하는 원칙이 있는데, 인증원과 JCI 인증이 내용면에서 비슷하다. 단 JCI의 경우 글로벌스탠다드이다 보니 내용면에서 폭 넓은 편이고, 인증원은 국내법이나 운용현황 등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입장에서는) 중복으로 받게 되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별도 조사가 이뤄지다 보면 피로도도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세브란스병원은 JCI 인증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 2019년 당시 특수한 상황과 맞물렸기 때문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JCI 인증을 받지 말자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2019년 당시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용인으로 옮길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고, 이후 병동 리모델링 등이 진행되면서 JCI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맞추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고재우 기자 (
고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