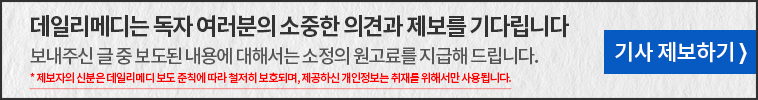뉴스 - 의원/병원

10년째 법정공방 IMS시술→학회 참석 의사 발길 '뚝'
대한IMS학회 홍기혁 회장 답답함 피력, '양한방 공생 모색 필요'
박정연 기자 (dailymedi@dailymedi.com)
2022.01.24 06:09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IMS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벌써 10년 째 재판정을 떠돌고 있다.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IMS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벌써 10년 째 재판정을 떠돌고 있다. 대법원은 구랍 30일 "이 사건 의사의 시술행위가 한방영역을 침범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두 번째 파기환송이었다.
대법원은 개별 사안임을 전제했지만 이 사건이 의료계에 미친 파장은 컸다.
특히 한의계는 "법원이 IMS는 한방의료행위임을 인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한의계는 "법원이 IMS는 한방의료행위임을 인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IMS학회 홍기혁 회장은 “대법원은 한방의료행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언급했는데, 충분한 의학적 판단이 이뤄졌는지 의아하다. 실제 대법원을 제외한 하급심들은 전부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IMS 시술은 아픈 부위, 일명 ‘통점’에 이뤄진다. 통증 부위가 한의학에서의 경혈과 우연히 겹칠 수도 있다. 또 통증 부위를 찾는 과정에서 촉진은 자연스럽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의사가 IMS 시술을 실시하면서 IMS전용 플런저(Plunger)를 사용한 기록을 제대로 남겨두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플런저는 IMS 시술에서 니들을 근육 안으로 밀어넣기 위한 도구다.
IMS 학회 권고에 따르면 한방의료행위로 오인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술시 반드시 IMS 전용 플런저와 니들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시술 후 바늘만 환부에 남겨둬서도 안 된다.
홍 회장은 이어 “대법원이 두 번째 파기환송을 하면서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오랜 시간 재판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국내 IMS 학계를 위축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0명 오던 IMS 학회, 이제는 100~150명 수준”
“2000명 오던 IMS 학회, 이제는 100~150명 수준”“얼기설기 만들어진 관련법, 명확한 제도화 필요”
실제로 한국 IMS학회는 나날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일명 ‘부흥기’였던 2000년도 초반에는 개원가는 물론 대학병원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졌었다. 학회 임원 또한 대학병원 교수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하지만 한방의료행위 논란에 휘말린 이후 교수들은 IMS 시술을 놓게 됐다. 교수 회원이 없으니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연구가 이뤄지지 않으니 시술 자체가 점점 사장되는 분위기다.
홍기혁 회장은 “학회 학술행사만 봐도 한창 때는 2000명 넘게 참석했다. 하지만 요즘은 참석자가 100명에서 150명 정도”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의료역량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떤 시술법이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역량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떤 시술법이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MS 시술의 현행 규정에 대해 “대단히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의사의 IMS 시술은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 IMS 시술 중 전기자극을 통한 치료를 인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건식 시술(dry needling)은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 전후로 비급여가 인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홍 회장은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7년 7월 요양급여기준규칙을 개정하기 이전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한 곳에 대해서만 법정 비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관련해 학회 등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의료기술 인정 신청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여태까지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홍 회장은 IMS 시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양방과 한방이 상호 협력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초창기 학회 때는 한의사들이 청강하러 오기도 했는데, 막지 않았다. 오랜 시간 이어지는 IMS 갈등의 끝을 위해선 의료계와 한의계의 건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중립적인 정책 조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중립적인 정책 조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정연 기자 (
박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