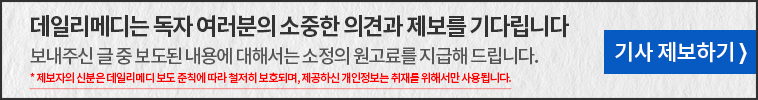오피니언 - 칼럼

'실손보험의 공보험화 논의 시점 도래'
김성주 회장(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데일리메디 기자 (dailymedi@dailymedi.com)
2022.03.20 16:36
 [기고]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 원인으로 늘상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는다. 자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입자들이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하는 탓에 손해율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고]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 원인으로 늘상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는다. 자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입자들이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하는 탓에 손해율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상품 개발 당시 예견하지 못한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비겁한 행태다.
보험사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 보다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카드를 꺼내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 타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실손보험 시장은 왜곡된 상태로 성장하며 보험회사와 가입자 모두 각각의 피해로 고통 받는 ‘계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도 실손보험 누수를 가입자의 의료쇼핑과 병원들의 과잉진료에 기인한 것처럼 호도하며 보험료 인상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2020년 기준으로 이미 3800만명 이상 가입하며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우고 있지만 그 운용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의 수익에만 치중돼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총진료비 102조8000억 중 건강보험은 67조1000억을 차지했다. 나머지 35조원은 법정본인부담금 20조1000억원과 비급여 15조6000억원으로 채워졌다.
비급여 15조6000억원 중 11조원이 실손보험에서 지급됐다.
또한 2020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OECD 평균인 80%에 비해 저조하지만 중증 고액 진료비 내 질환의 보장률은 82.1%를 보이는 등 의미있는 공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실손보험을 공보험 영역에서 운용해야할 명분이 더욱 뚜렷해진다.
실손보험 적자를 언제까지 국민이 메워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손보험을 공보험에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보험회사들은 적자를 주장하고 있으니 크게 반대할 이유도 없다,
실손보험의 공보험화는 △간병인 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의료비 통제 △의료정보 보호 등 산적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보험회사들에게 실손보험 적자의 늪에서 탈출 기회를 줌으로써 오히려 국가가 큰 틀에서 공사보험 역할을 재정비하는 기회를 마련하길 제안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메디 기자 (
데일리메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