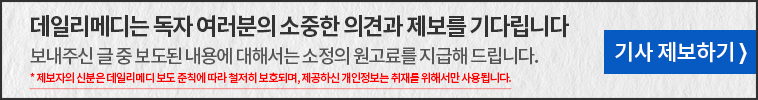“너 의사면 돈 잘 벌어서 좋겠네.”
고등학교 동창회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맥주잔을 집어들며 무신경하게 말했다. 그 당시 나는 겨우 20대 초반 의예과생이었으니 의사도 아니었고 돈을 벌 시기는 더더욱 아니었다.
넉살이 좋거나 말주변이 있었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리 친하지도 않았던 동창이 대뜸 꺼낸 불편한 주제에 당황한 나는 어색하게 마치 변명하듯 말했다.
“글쎄, 나는 아직 의대생이야. 의사도 아니고···”,
하지만 돌아온 답은 “그거나 그거나. 나도 의대나 갈걸” 이었다.
나는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다. 대신 틈을 봐서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때쯤이었다. 나는 의사와 예비의사들이 사람들에게 미움받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의사 집단이 상당히 폐쇄적인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주변 시선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 같았다. 잘난척 한다는 둥, 돈만 밝힌다는 둥.
"세간 편견보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은 직종이 의사인데 안타까움"
막상 내가 경험한 주변 의대생이나 의사들은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 보였기에 세간의 편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들었다.
시간이 흘러 의대를 졸업할 즈음에는 그런 막연한 장벽 때문에 의료계 분야가 아닌 사람들과는 교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의사들은 ‘이기적인 고소득 기득권층’이라는 날선 반응에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 쏟아부은 고된 노력은 부정당하는 것만 같아 속상했다.
대학병원 인턴으로 진짜 의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극단적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악의 없는 이야기마저 짜증이 날 지경이었다.
유난히 무더웠던 그해 여름, 직장인 친구들이 ‘퇴근길이 너무 덥다’고 호소할 때 마저 나는 굳이 거기다 대고 신경질이 잔뜩 섞인 비아냥을 던졌다.
“매일 퇴근도 하다니 팔자도 좋구나. 나는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날이 있는걸···. 너희도 나처럼 퇴근을 못하면 바깥 날씨가 더운지 시원한지도 모를거야.”
그렇게 갈길 잃은 피해의식은 켜켜이 쌓이고 있었다.
내가 인턴으로 근무하던 응급실은 공단 근처에 있었다. 자연히 현장 노동자들이 부상으로 오는 일이 잦았다. 그날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중년의 사내가 손을 다쳐서 왔다. 사실 다쳤다는 것은 너무 얌전한 표현이다.
남자의 한쪽 손은 온통 피칠갑에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응급실엔 하루종일 다친 사람들이 오지만 상당히 심하게 다친 사람이었다. 응급실 근무가 처음이었다면 적잖이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계절은 이미 늦여름이었고 인턴이 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나는 피떡이 된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도 어느정도 익숙해지던 차였다. 초진 기록을 하러 차트를 들고 가서 말을 건넸다.
“환자분, 여기 손을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남자는 성의있게 자세히 설명했지만 나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작업용 장치 이름이나 작동 원리를 건성으로 대강 넘겨듣고 차트에 간단히 휘갈겼다. ‘기계에 손 낌’.
일단 상처부위를 깨끗이 하기 위해 식염수를 넓은 대야에 준비했다. 나는 식염수 병뚜껑을 따며 졸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어쩌면 그 환자의 손을 반쯤 갈아버린 무심한 기계만큼이나 나는 무신경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참 좋은 직장서 일하시네요.”
처치실 의자에 기대 앉은 환자가 나에게 대뜸 말했다. 진료와 상관이 없는 대화이긴 했지만 환자는 충분히 정중했기에 친절하게 응대해도 됐을 법 한데, 밤새 당직 근무에 시달리며 있는 대로 날카로워진 나는 그 한마디에도 기분이 좋지 못했다.
그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나, 경계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식염수를 콸콸 붓는 일만 반복하고 있었다.
좋은 직장이란 게 무슨 뜻이지? 설마 지금 내가 허연 가운을 입고 젠 체하는, 돈 많이 버는 의사라 부럽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어휴, 상상만 해도 천번만번 사양하고 싶은 피곤한 대화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당시 나의 기준에서 좋은 직장에 한참 못 미쳤다. 잠은 커녕 엉덩이를 언제 마지막으로 붙여봤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인턴 월급은 최저 시급에도 한참 미치지 않았고 나는 이곳의 최하위 계급으로 노비처럼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이었다.
"의사는 환자 통해 배운다. 어려운 상황 환자들 보고 접하면서 상대 이해하는 마음 생겨"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좋겠다는 거야. 왈칵 신경질이 치밀어 오른 나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자는 혼자서 술술 말을 이었다.
“여기 응급실 말입니다, 에어컨이 잘 나오잖아요. 지금 밖에 무진장 덥거든요.”
나는 순간 놀라서 고개를 들어 남자를 쳐다봤다. 나의 모든 예상은 와장창 빗나갔다. 이 환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건가?
“이렇게 시원한 직장이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날이 굉장히 더운데 작업장 냉방이 엉망인 바람에 지금 우리 팀은요 엄청 고생 중입니다.”
그는 나의 하얀 가운이나 학벌, 연봉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비로소 눈을 마주쳐 바라본 환자는 약간의 미소마저 띠고 있었다.
“아이고 에어컨 바람 쐬니까 이제 좀 살겠네요.”
그는 반쯤 말라붙은 이마의 땀을 너덜너덜하지 않은 쪽 손의 소매로 쓱 훔쳤다. 당장 죽겠다고 비명을 질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크게 다친 남자는 오히려 살 것 같다며 만족하고 있었다.
더운 날씨 탓에 자기 동료들이 고생한다며 타인을 걱정하고 있었다. 기껏해야 조카뻘 되는 사회 초년생이 자신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흔히들 의사는 환자를 통해 배운다고 한다.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쌓는 경험과 지식 가치를 일컫는 것이다. 하지만 그날 그 환자가 나에게 보여준 것은 조금 결이 다른 것이었다.
질병 경과가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였다. 불필요한 피해의식이나 편견을 갖고 마음의 벽을 쌓는 대신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가짐이었다.
내가 고생스러우니 너도 당해보라는 심보가 아니고 나의 어려움을 당신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넓은 마음가짐이었다. 판이하게 다른 직종이나 연령대, 성별에도 편견을 갖지 않는 태도였다.
나의 졸렬함은 그에 비하면 한없이 부끄러웠다. 스스로 입장만 강조하고 반대로 타인 고충은 이해하려고 애써보지 않았다.
몇 년 전 의사 파업에서도 드러나듯 의사와 시민사회 간에는 여전히 갈등이 만연하다. 각각의 집단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각을 세워오고 있다. 환자와 의사 관계로 따지자면 ‘라뽀’가 손상된 상태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공통점이 더 많다. 깊은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상호 간 노력이, 갈등보다 깊은 이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데일리메디 기자 (
데일리메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