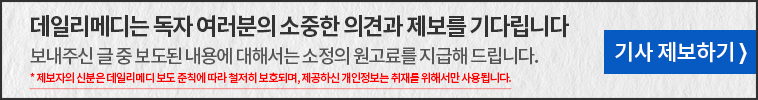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
최근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불확실성 문제가 대두됐지만 국회, 환자단체 등의 요구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 조건으로 등재되는 추세다.
이는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환자 접근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국내 환경에 맞는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보건당국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 약제성과평가개발부는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실제 근거(RWE) 생성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긴급 공고했다.
사후관리를 위한 약제성과평가의 주요 자료원인 실제 자료(RWD, Real-World Data), 실제 근거(RWE, Real-World Evidence) 등은 비뚤거림(bias) 발생 위험으로 RWE 생성 신뢰도 향상을 위한 추가적 대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미 주요 국가도 의사 결정을 위해 자국 RWE 가이드라인을 개발, 평가에 활용하는 추세다.
주요사례를 보면 ▲영국(NICE RWE Framework) ▲영국(HARmonized Protocol Template)▲캐나다(Guidance for reporting RWE )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구 설계 및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연계, 통계적 분석 방법, 민감도 분석 및 보고 등을 핵심 사항으로 포함했다.
지난해 열린 ‘RWD(Real-World Data) 기반 고가의약품 성과평가’ 국제심포지엄에서도 사후 평가를 위한 RWE 근거 기준 강화 필요성이 주목받았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 대만 국립대학암센터(NTUCC), 덴마크 의약청(DKMA) 등 국제 주요 보건의료기관이 참여해 각국 RWD 활용 경험을 발표하며 발전적 제도 필요성을 제언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심포지엄에서 “의약품을 포함한 고가 의료기술성과 평가에 RWD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국내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RWE 생성 및 제도 수용성 향상을 위한 RWE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연구용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RWE 체계 확립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국내·외 RWD 현황 분석 및 RWE 활용 제언 ▲RWE 생성 가이드라인 개발 등 2가지로 지목됐다.
연구팀은 영국 NICE, 캐나다 등 주요국의 RWE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연구 설계, 데이터 품질 관리, 통계 분석 방법 등을 포함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의 기대효과로 ▲건강보험 급여 결정의 신뢰도 제고 ▲재정 효율화 ▲환자 접근성 향상 ▲환자 접근성 향상 ▲RWE 활용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꼽았다.
즉 건강보험 급여 결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급여 등재 후 실제임상근거(RWE)를 활용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심평원은 “신뢰도 높은 RWE를 기반으로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제약사는 표준화된 자료 제출을 통해 약제 성과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나아가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를 통해 RWE 기반 사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