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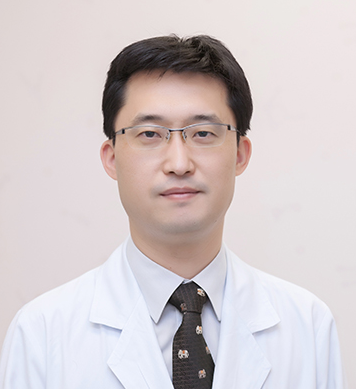 내가 의대를 지원한 이유는 인간 신체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내가 의대를 지원한 이유는 인간 신체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어릴 적부터 나를 괴롭히던 만성두통 원인이 늘 궁금했었다.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나의 두통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신체 원리를 배우는 것은 양자역학이나 미분방정식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실용적인 일이었다.
문제는 전공과목을 정하는 것이었다. 의과대학은 인체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진료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 환자를 진료한다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턴이 끝나갈 때까지도 전공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 선택한 소아청소년과, 동료 전공의들 중에도 비슷한 사람 태반"
결국 전공을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소아청소년과가 결코 인기과는 아니었지만,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면서 경제적인 수입이나 전망 같은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필자도 참으로 대책없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했지만 들어와 보니 정말 어쩌면 하나같이 나보다 더 대책이 없는 사람 투성이던지….
미래 전망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아이들이 예쁘고 좋아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회진이 끝나면 어느 병동 귀염둥이가 얼마나 예쁜 말을 했는지가 화제였다. 교수님들은 “애가 불쌍하잖아…” 또는 “어쨌든 살리고 봐야지…”를 입에 달고 사셨다.
그런 소아청소년과가 현재 위기다. 2023년도 전공의 지원율이 16.6%에 불과했다. 여기에 최근 5년간 600곳이 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폐업했다.
소아청소년과가 예전에도 어차피 화려한 전망이나 대단한 수입을 기대하고 지원하던 과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지원율이 낮아진 것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전공의들조차도 차마 지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아청소년과 상황이 처참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의 한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입원 진료를 중단한다고 해서 이슈가 됐지만 이미 수개월 전부터 전국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입원과 응급 진료를 축소, 폐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某대학병원은 전체 교수가 8명이었는데 현재는 단 2명만 남아 소박하게 외래 진료만 보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동네 소아과들마저 문(門)을 닫고 있으니 정말로 1차의료까지 심각한 위기다.
중증 소아환자 진료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당장 폐렴, 장염 환자 진료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소아암이나 선천성 심장병 환자를 위한 중증 소아 환자 진료체계가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는가.
"소아과, 심각한 붕괴 위기 직면…개인적으로 환자 적게 봐서 2022년 적자 줄어 자괴감"
소아청소년과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에 있다.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주변 반응은 똑같다. “또 수가 타령이냐?” 그럼 수가가 문제인데, 다른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박리다매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출산율 저하 직격탄을 맞은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은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게다가 중증 소아 환자 진료는 박리도 아니고, 진료할수록 마이너스다.
얼마 전 병원에 2022년 필자의 진료 실적을 문의했다. 작년보다 적자가 줄었다고 하길래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자가 줄어든 이유가 작년보다 내 입원환자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환자가 줄어야 경영에 도움이 되는 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자괴감이 들 뿐이다.
내 전공인 소아혈액종양은 대형병원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개개 병원의 책임감에 기대는 국가 의료시스템이 과연 유지가 가능할까?
"수가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상화' 해달라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수가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수가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생아 중환자실을 보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생아 중환자실 침상이 부족해서 산모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닌다는 뉴스가 빈번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를 대폭 인상한 후에서야 비로소 전국 병원들은 자발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침상 수를 늘리고 의료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나는 요즘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다. 아이들을 예뻐하고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노력이 보답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런 노력과 선의가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불러온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더 이상 묵묵히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가 연수를 갔던 미국에 있는 병원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Every child deserves a future' 해석하면 모든 아이가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과연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은 아이들 미래를 지켜줄 준비가 돼있는 걸까.
선의와 헌신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소아청소년 진료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을 간절히 호소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