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트랜스젠더는 약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전문의 수련과정에서도 트랜스젠더의 외과적 수술은 배제된 상태로 이들을 관리할 의료진 역시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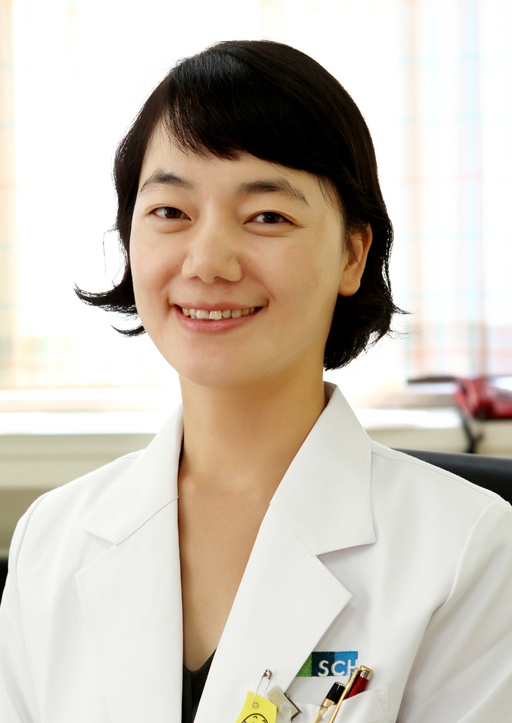 1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청원홀에서 진행된 ‘트랜스젠더와 의료’ 심포지엄에서 데일리메디와 만난 이은실 교수(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사진]는 “시대가 변하면서 트랜스젠더가 늘어나고 있다.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이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청원홀에서 진행된 ‘트랜스젠더와 의료’ 심포지엄에서 데일리메디와 만난 이은실 교수(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사진]는 “시대가 변하면서 트랜스젠더가 늘어나고 있다.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이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 118개국 중 43개국이 성전환수술과 호르몬요법을 수면 위로 올리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국내 의 실정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모든 수술과 치료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다수 의료진 역시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부재한 상태라는 것이다.
결국 트랜스젠더는 수천만원을 들여 수술을 진행하고, 의학적 검증 없이 자가 요법으로 호르몬 주사를 맡는 등 이른바 ‘의료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전문의 수련과정에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과정이 갖춰지지 않아 의사들의 인식도 사회적 차별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성전환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인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네덜란드는 트랜스젠더 수술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도 주 마다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뉴질랜드도 트랜스젠터 급여화가 이뤄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차링 크로스 젠더 클리닉(Charing Cross Gender Identity Clinic) 등 국가적으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트랜스젠더들의 성별 위화감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도 트랜스젠더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바른 진료와 정책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나 토론회를 벌여 사회적 인식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승현 이사는 “트랜스젠더 건강에 대한 논의의 시작에는 의료인과 트랜스젠더의 대등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의학계와 의료계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편견 없는 이해와 현실의 삶의 여건들을 파악한 후 궁극적으로 트랜스젠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트랜스젠더 의료의 전제이자 목표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트랜스젠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 WPATH)가 발행하는 ‘트랜스섹슈얼·트랜스젠더·성별 비순응자를 위한 건강관리실무표준 제 7판’ 한국어판이 지난 4월 공식 발표됐다.
WPATH의 건강관리실무표준은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가장 최선의 과학적 지견과 전문가의 합의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의료지침서로 지난 1979년 1판이 제작된 이후 개정을 거듭해 현재 7판까지 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