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치료받지 못한 이들의 사회적 문제는 커지고 있다.
반면 지역 정신병·의원은 물론 대학병원의 정신병동은 줄고 정신과 진료도 축소되고 있다. 여기에는 ‘관리는 골치 아픈데 돈도 안 된다’는 이유가 따른다.
이런 상황에 한 대학병원이 정신과 진료를 대폭 확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일산차병원(원장 송재만)은 최근 "암환자, 직장인, 주부, 노년층, 난임 부부 등 전(全)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의학과를 확장해서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본관 3층에 330㎡(100평) 규모로 정신건강의학과를 확장하며 3개 진료실과 5개 치료·검사·평가실을 마련했다.
또 비약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암환자와 만성질환자, 임산부, 난임 환자 등 모든 진료과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과 함께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김민경 일산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수석과장은 데일리메디에 “지난해에 비해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50% 이상 늘었다. 일반 외래 환자도 늘었고, 다른 과에서 협진 의뢰도 크게 증가했다. 이와 더해 환자들의 중등도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환자수 증가는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또 암환자나 심혈관 질환 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정신질환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차병원은 출산과 난임 등 여성 관련 진료의 특화로 여성 환자가 많은 것도 한몫했다.
김 과장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불안증이 더 많이 나타나는 편이다. 임신과 산후 우울을 비롯해 여성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정신건강을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이번 확장이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돈 안 되는’ 문제는 여전…‘멘탈 케어’로 신체질환자 치료 완결성 높여
환자수는 급증했지만, 여타 병원에서 겪는 ‘수지타산’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다.
김 과장은 “종합병원급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수지만, 수익적 측면의 어려움으로 축소되고 있다. 우리도 다른 과에 비해서는 수익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강화한 것은 ‘치료의 완결성’ 때문이다.
김 과장은 “암환자 중 치료를 받다가 심리적으로 힘들어 중단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동시에 연령이나 질환 등 환자의 특성에 따라 전문치료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수익은 몰라도 각 주요 질환에 대한 서포트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일정 보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과 진료, 진학‧취업에 걸림돌 된다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대학병원의 정신과 진료 축소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과장은 “정신과 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대학병원에서의 전문적 진료, 특히 스트레스 요인과 단절될 수 있는 입원치료에 대한 인식개선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환자 중에는 여전히 정신과 진료기록이 대학입시나 공무원 임용 등에 영향을 줄 것이란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 일부 보험사에서는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가입이나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며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김 과장은 “정부에서 국민 대상으로 정신과 진료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 또 공보험뿐 아니라 사보험에서도 정신과 진료를 보장해주지 않아 환자들이 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제도적 개선도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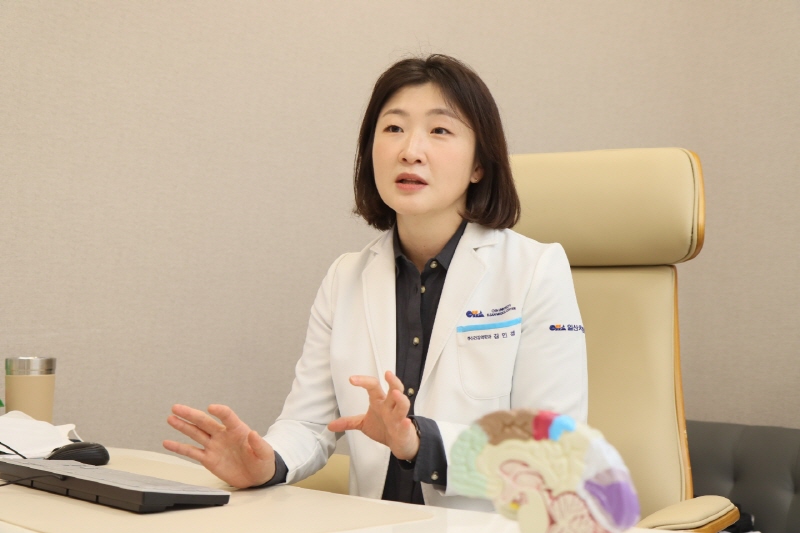
뇌파나 디지털 치료기 등 정신과 질환과 관련된 새로운 의료기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들 기술의 빠른 도입도 요구됐다.
김 과장은 “우울증 환자는 약물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비율이 30%밖에 안된다. 애초부터 약물 치료를 꺼리는 환자도 늘고 있다. 이들에게 맞는 다양한 비약물 치료를 통해 치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만, 여러 기술의 허가나 급여 적용에 있어 더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일산차병원을 비롯해 일선 병원의 정신과 진료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경두개자기자극술은 우울증 약물 치료에 반응이 떨어지는 환자에 대한 효과가 확인됐지만 비급여로 인해 치료에 적극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김 과장은 “약물이 뇌 신경세포에 밥을 주는 것이라면, 비약물 치료는 신경세포를 물리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것과 같아 치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며 “의학적인 근거에 따른 지원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 준다면 훨씬 더 환자들의 치료 성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
. .
.
( ) ", , , , () " 14 .
3 330(100) 3 5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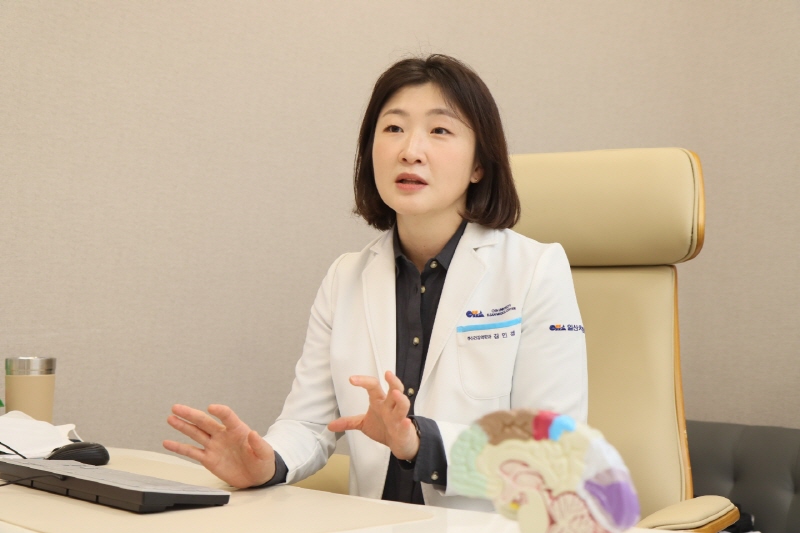
, .
30% . . , .
.
, .

